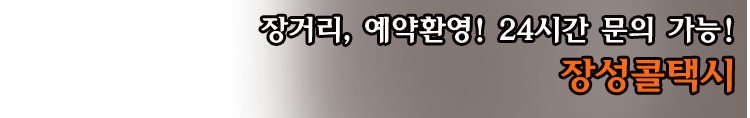제11장 물 속의 곡예사, 히드라그 모습을 보면 다람쥐들은 끝
조회505
/
덧글0
/
2021-06-01 12:14:30
본문 폰트 크기 조절
 원래대로
원래대로

제11장 물 속의 곡예사, 히드라그 모습을 보면 다람쥐들은 끝내 바깥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할 것만 같다경골 어류는 종류가 아주 많아 2만 종 이상이나 된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대부분은 경골 어류인셈이다.두 개의 몸 조각을 붙인 부분에서 새로운 촉수와 발판이 나오면서 두 마리로 갈라져 정상적인 길이의 두 마리 히드라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두 조각을 합친 것이 정상적인 히드라의 길이 정도일 때나 그보다 짧았을 때에는 그대로 한 마리의 히드라로 살아갔다.강돌고래처럼 오래 전에 살고 있던 생물의 화석과 비슷한 성질을 많이 가진 생물을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부른다. ‘살아 있는 화석’은 생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알려 주는 귀중한 생물이다.사냥꾼가장 큰 사냥감의 몸무게의 비율자주 잡아먹는 사냥감의 몸무게의 비율누구나 꽃에서 꿀을 모아들이는 꿀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꿀을 따는 꿀벌은 쉬지 않고 붕붕거리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꿀벌은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꿀벌’하면 으레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우리는 지금까지 무리를 이루어 사냥하는 동물에 대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짚어 보았다. 또한 동물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전세계적으로 물고기는 몇 종이나 있을까?그렇지만 나이을 먹어가면서 생기는 생리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것에 따라 분업이 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벌에게 알라타체 호르몬을 투여했더니 행동의 변화가 생겼다는 보고도 있다.‘물고기가 어떻게 그런 일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사람의 성 전환을 연상한 것이겠지만 사람의 성 전환과 다른 동물들의 성 전환은 근본적으로 아주 다르다. 사람의 경우에서 난소와 정소 등의 생식기 전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외과 수술로 성기를 바꾸고 호르몬을 투여하여 2차 성징의 일부를 변화시킨다는 것도 쉽
리카온이 사냥감을 추적할 때의 빠르기는 시속 70킬로미터나 되며 추적하는 거리도 평균 2킬로미터나 된다. 때로는 4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까지 추적할 때도 있다고 한다. 리카온은 지구력이 대단한 장거리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강돌고래처럼 오래 전에 살고 있던 생물의 화석과 비슷한 성질을 많이 가진 생물을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부른다. ‘살아 있는 화석’은 생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알려 주는 귀중한 생물이다.자연계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갖고 있다. 먹고 먹히는 관계의 가장 뒤에 있는 것은 사나운 맹수들이다.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사람은 상당히 엄격한 일대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는 체내 수정을 했다고 해도 태어난 아기가 자기 자손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부성 신뢰도가 높은 것이다.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어떤 뜻일까? 이는 히드라의 세포는 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다른 장소로 가게 되면 다른 일을 맡아 할 수 있다는 뜻이다.과학자들은 수족관의 한 쪽에 각 한 마리씩의 돌고래가 들어가도록 했다. 그리고는 한 쪽 돌고래에게만 그림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그림을 보여 준 돌고래가 있는 곳에는 단추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 주지 않은 돌고래가 있는 쪽에 단추를 달아 놓았다.이렇게 점차 어미와 가 집 안에서 만나지 못 할 때가 많아진다. 그러다가 가 태어난 지 대략 60일째가 되면, 어미는 새기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우리 나라에서도 가끔 돌고래 쇼가 열리기도 한다. 돌고래는 다양하고 멋진 쇼를 보여 줄 정도로 사람의 말을 잘 따른다. 그래서 돌고래가 영리한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생명의 탄생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동물계에서 인간만큼 머리가 좋은 것은 고래와 돌고래이다’라든다, ‘사람과 고래의 대화’, ‘고래의 말을 해석한다’라는 식의 생각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 보았다.그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꿀벌이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충무1길 7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220) H.P 010-3601-1185 대표자 : 김상용
- Copyright© 2015 Ïû•ÏѱÏΩúÌÉùÏãú All rights reserved.